|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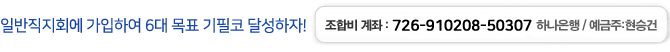 |
  |
| 올린이 :
법원 |
조회수: 698 추천:178 |
2016-01-25 10:28:43 |
|
|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


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1-24 14:19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焚身)해 숨진 건설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분신에 이른 사정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저 분신할 겁니다” 2013년 12월 13일 낮 3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 전화를 건 A씨(사망 당시 48세)의 손에는 휘발유 통이 들려있었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이 제주 관광호텔 신축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다. 그의 몸은 이미 휘발유에 흠뻑 젖어있었다.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A씨와 원(原)도급업체의 현장소장, 경찰관 및 소방관 등은 체불 임금 문제를 논의했다. 원도급업체 관계자의 입에서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재하도급업체) 사람이 오면 입회 하에 정산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 순간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몸 절반에 화상을 입은 A씨는 그날 밤 숨을 거뒀다.
그의 분신은 '임금 체불' 때문이었다.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분쟁이 시작된 직후였다. A씨는 호텔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다. 원도급업체가 12억6000만원에 하도급업체에 넘긴 이 건은 다시 A씨의 형이 운영하는 '재하도급업체'에 10억원에 떨어졌다. A씨는 재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일용직이었다. 호텔(갑)-원도급업체(을)-하도급업체(병)-재하도급업체(정)로 이어지는 계약 사슬의 가장 밑바닥이었다.
양측은 재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누가 줄 것인지를 놓고 싸웠다. 발을 동동 구르던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원도급업체 현장사무실로 가 농성을 벌였다.
현장 소장은 결국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체불임금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게만은 “당신은 사장 친동생 아니냐, 당신 몫은 마지막에 정산하자”고 버텼다. 이는 A씨가 분신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다 사망한 것이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A씨의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행위”라며 “망인의 업무였던 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사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
|
|
|
|
|
![]()
 추천하기
추천하기
|
|